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매년 현충일이면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진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 친일 경력이 확인된 인물이나 민주주의 훼손에 연루된 이들이 함께 안장돼 있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역사 정의’의 회복을 둘러싼 제도 정비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 국립묘지, 단순한 추모의 공간을 넘어서
국립대전현충원은 1985년 서울현충원의 포화에 따라 조성된 국가 단위의 국립묘지다. 군인, 경찰, 소방, 독립운동가, 의사자 등 다양한 공적 인물들이 안장된 이곳은 단순한 안장 공간을 넘어 ‘국가가 누구를 기억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묘역에는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알려진 백선엽, 김창룡 등 친일 행적이나 반민주 정치사와 연관된 인물들이 다수 안장돼 있다. 같은 장소에 독립운동가와 친일경력자가 함께 안치된 현실에 대해 시민사회는 “기억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 이재명 대통령, “친일 청산은 시대 과제”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8월 대선 후보 시절,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방명록에 남겼다. 당시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 그는 “친일 청산 문제는 지금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며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선언을 넘어, ‘국립묘지 자격 기준’ 논쟁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이장 근거 마련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요구돼 온 과제다.
■ 국립묘지법 개정 가능성 다시 떠오를까
현행 국립묘지법은 ‘형사처벌’이나 ‘서훈 취소’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안장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이장을 실행한 사례는 드물다. 이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나 민주주의 파괴에 연루된 인사에 대한 일괄적 기준 마련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제70회 현충일에도 대전 시민사회는 관련 캠페인을 통해 국립묘지법 개정을 촉구했고, ‘기억과 추모의 기준’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 기억의 전당, 다시 정의롭게 설 수 있을까
국립묘지는 국가가 기억하는 인물들의 공간인 만큼, 그 상징성과 기준은 언제나 공론의 대상이 된다.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어떤 인물이 ‘공적 기억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정비를 필요로 한다.
국립묘지법 개정은 단지 과거를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 위에 서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입법·행정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민족문제연구소의 한 인사는 “국립현충원은 국가가 역사적 정당성을 선언하는 장소”라며 “식민지배에 협력하거나 민주주의를 훼손한 인물들이 지금도 그 공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해방 이후 우리가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묘지법 개정은 단죄가 아니라 공적 기억의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며, 이는 역사적 책임의 문제이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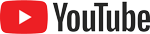 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