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봄바람이 스치는 대전시청 북문 앞 광장. 노란 리본과 손피켓을 들고 선 사람들 틈에서 기자는 11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텔레비전 너머로 생중계되던 침몰, 울부짖는 유가족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차디찬 명령. 그 기억은 오늘도 ‘진실’을 부르고 있었다.
세월호참사 11주기. 그날로부터 400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상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권의 구호도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은폐된 자료”는 열리지 않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는 지켜지지 않았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회의 문턱에서 수년째 멈춰 서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었다. 이날 발표된 ‘기억다짐주간’은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노동계, 종교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한 것은 단순했다. 진실의 공개. 책임의 이행. 그리고 구조적 안전의 제도화.
이태원참사 유가족 김숙자 씨는 “세월호 어머니들께 묻고 싶다. 저는 어떻게 견뎌야 하나요”라고 말했다. 절망이 가득한 고백이었지고, 현장의 침묵은 연대였다. 세월호와 이태원, 이름은 달라도 고통의 본질은 같았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은 참사. 그리고 그로 인한 반복.
민주노총,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교사·소방 공무원 단체까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이 구조의 문제였음을 증언하며,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들의 몫이다. 매년 4월, 우리는 기억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안다. 11년 전, 우리는 아이들에게 구조를 약속받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약속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은 여전히 더디다”는 준비위원회의 말은, 현장의 공기만큼이나 냉정하게 들렸다. 정치와 행정은 반복적으로 공감을 말하지만, 실질적 변화는 지지부진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개인의 감정으로만 수렴되고 있다.
기억은 멈추지 않았다. 행동도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세월호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이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사실이다. ‘기억하자’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남았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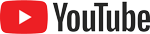 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