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임영호 동대전농협 조합장]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걸까?’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괴롭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평온하고 자유로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소유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 질문에 가장 지혜롭게 답을 주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이며 그 가르침의 핵심을 아주 짧고도 깊게 담고 있는 경전, 바로 반야심경(般若心經)입니다. 여기서는 법륜스님의 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반야심경은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라는 불교 경전으로 본문 260자와 제목 10글자를 합한 총 270자로 이루어진 경전입니다. 불교의 경전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중 가장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글 안에 삶과 괴로움, 해탈의 길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경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장 깊이 있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식어 “마하(摩訶)”는 산스크리트어로 ‘크고 위대한’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음을 뜻합니다. “반야(般若)”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모든 현상의 실상을 바로 꿰뚫어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괴로움의 원인과 해답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바라밀다(波羅蜜多)”에서 “바라(波羅)”는 저 언덕, “밀다(蜜多):는 건너다는 뜻이니, 지혜의 완성으로 윤회(輪廻)의 고통인 이 언덕으로부터 해탈의 피안(彼岸)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즉, 괴로움이 있는 세계에서 괴로움이 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밀다”는 모든 고(苦)에서 벗어나 열반(涅槃)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대승(大乘)불교의 목적인 일체 중생이 더불어 해탈의 세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심경(心經)“은 가장 요긴한 부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사상은 공(空)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공(空)’입니다. 이걸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잘못입니다. 불교에서의 공은 “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본래 진정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체 현상은 모두 각종 조건의 취합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변하면 현상도 역시 그것을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공(空)“은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없음을 뜻합니다.
손에 컵 하나를 쥐고 있다면 그 컵은 어디서 온 걸까요? 흙, 물, 불, 기술, 노동, 시간…. 그 중 하나라도 없었으면 컵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因緣)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소유와 자아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넓은 시야로 한발 떨어져서 세상을 보면 달리 수행할 것이 없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강조하는 ‘공’의 개념은 화엄경(華嚴經)에서 말하는 심여공화사(心如工畵師),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공 같다고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모든 존재나 현상은 마음이 지은 것입니다. 마음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면, 결국 모든 것이 ‘공’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 번뇌나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경전이 같은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
“색즉시공(色卽是空)”은 《반야심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로, 불교의 공(空) 사상을 가장 간결하고도 깊이 있게 표현한 말입니다. ‘색즉시공’은 “색은 곧 공이다.”라는 의미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색’은 물질적 존재, 모든 현상 세계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하지 않은 독립된 자아를 가진 실체가 아니며, 인연 따라 생겼다가도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본질적으로 공(空)합니다.
공즉시색(空卽是色)은 “공은 곧 색이다” 는 말로 이어지며, 이것은 단순한 부정이 아닌, 공성(空性) 자체가 바로 존재의 방식임을 말합니다. 구름을 예로 들면, 구름은 분명 ‘보이는 것’이지만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람·기온·수분 등 조건이 맞을 때 생겼다가 흩어집니다.
하늘의 기류가 바뀌면 또 다른 구름이 생기고 흩어지고 다시 모입니다. 이런 존재 방식은 ‘실체 없음’, 곧 공(空)을 의미합니다. 구름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한히 다양한 모습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색즉시공(色卽是空)의 핵심 메시지는 "색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색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한 조건적 존재’이며, 이것이 곧 공(空)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고정된 자아나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합니다. “색즉시공”은 단순히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통찰의 눈을 여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다섯 가지 요소, 오온(五蘊)입니다.
인간을 다섯 가지 요소, 오온이라 말합니다. 몸(色), 느낌(受), 생각(想), 의지(行), 의식(識)―이것은 세상의 모든 현상인 물질과 정신을 뜻합니다.
색色)은 세상에 있는 물질 현상계 전체로 인식의 대상입니다. 수(受)는 눈으로 외부대상을 보았을 때 일어나는 감각과 느낌, 상(想)은 보이는 사물에 대해 형성되는 개념으로 저장된 정보를 기억해 내는 작용입니다. 행(行)은 의지작용으로 뜻·말·몸으로 하는 세 가지 행동입니다. 식(識)은 이해나 인식, 판단이나 분별을 의미합니다.
색이 물질적 측면을 말한다면, 수·상·행·식은 인간의 정신적 측면을 의미합니다. 색을 포함한 오온(五蘊)은 본래 실체가 없는데 있는 것으로 집착하고 있는 망상들입니다.
내가 나인 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몸이 나일까요? 감정이 나일까요? 기억이 나일까요? 이 모든 건 계속 바뀝니다. ‘나’라는 것도 사실은 색·수·상·행·식 다섯 가지의 조건이 잠시 모여 나를 이루는 인연의 집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체의 존재현상, 십이처(十二處) 십팔계(十八界)
우리는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눈으로 글자를 인식하고, 의미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각기관으로 대상을 보고, 의미를 이해하는 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요소가 모여야 비로소 경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십팔계(十八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18계'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 관련된 요소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六根(육근)으로 불리는 6가지 감각 기관 眼, 耳, 鼻, 舌, 身, 意(눈, 귀, 코, 혀, 몸, 의식), 그리고 이 기관들이 대응하는 6가지의 대상(六境) 色, 聲, 香, 味, 觸, 法(색, 성, 향, 미, 촉, 법)을 십이처(十二處)라하고, 그 감각 기관과 대상이 만나서 생겨나는 6가지의 의식(六識)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합쳐서 총 18가지의 개념입니다.
세상은 내 감각과 해석을 통해 구성됩니다. 십팔계는 감각기관·감각대상·인식작용이 만날 때 일시적으로 생기는 조건적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눈(眼根)은 빛(色境)과 더불어 보는 작용(眼識)하여 색을 경험합니다. 십팔계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십이연기(十二緣起)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진리를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지(無知)와 무명(無明)은 매우 핵심적인 개념으로,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인 번뇌(根本煩惱)입니다. 두 단어는 때로는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의미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지(無知)는 알지 못함, 지식이 없다는 뜻으로 일상적이고 표면적 무지를 말합니다. 이는 공부나 경험으로 해결이 되지만, 무명(無明)은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무지로 四聖諦(사성제)·八正道(팔정도) 수행과 깨달음을 통하여 끊어내야 합니다.
불교에서 모든 고(苦)의 원인은 첫 번째 연기인 무명(無明)에서 비롯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마음이 우리 인생의 고통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무명(無明)이 소멸되면 열반에 이르게 되고, 무명이 있음으로 행(行)이 일어나고, 열두 연기의 순환구조로 계속 윤회(輪廻)가 이어집니다.
어떤 착각이 우리를 괴롭게 할까요? 예를 들면, 이 관계가 영원하리라 믿는 것, 이 물건이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줄 것이라는 생각, 내가 반드시 이래야만 행복하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조건이 바뀌면 무너집니다. 그것을 모르면 괴로움은 반복됩니다. 십이연기(十二緣起)의 흐름을 깨닫고, 그 고리를 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십이연기(十二緣起)는 고통이 생겨나는 과정을 12단계로 설명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물이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뜻합니다. 일체의 사물이나 현상의 발생은 모두 상대적인 의존관계나 조건관계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상호관계나 조건관계를 떠나서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도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연기는 무명(無明)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명은 空(공)·四聖諦(사성제)·八正道(팔정도) 진리를 모른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나'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행(行)―습관·행동, 식(識)―마음·의식, 명색(名色)―마음과 몸 결합, 육입(六入)―감각기관 6개, 촉(觸)―감각기관과 대상의 접촉, 애(愛)―집착, 취(取)―소유, 유(有)―취에 형성된 존재형성 집착, 생(生)―탄생, 노사(老死)―늙고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끝납니다.
결국, 고통은 첫째 연기인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어느 단계든 끊으면 윤회의 고통 사슬이 멈추지만, 근원적 해탈을 위해서는 무명(無明)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즉각적 고통 중단을 위해서는 애(愛)·취(取)를 제거하는 수행이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상태와 능력에 따라 끊어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무명(無明)을 깨뜨려 완전한 해탈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합니다.
불수자성 수연성(不隨自性 隨緣性)
이는 불교의 연기(緣起)와 공(空) 사상을 설명하는 핵심 원리 중 하나로, 존재가 고정된 본질(自性)에 따라 존재하지 않고, 조건과 인연에 따라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不隨自性, 자성, 본래의 성질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물은 고정된 본질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隨緣性, 인연(因緣)에 따른다는 뜻으로 사물은 조건(因緣)이 모여야만 존재합니다. 어떤 것도 고정되고 독립된 본성(自性)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변 조건(因緣)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꽃이 핀다 → 꽃 자체의 본성(自性) 때문이 아니라 햇빛·물·공기·씨앗 등 조건(因緣)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본성에 따라 본다면 → 집착과 실체적 분별이 생김 → 괴롭지만 연기(緣起)와 연성(緣成)에 따라 본다면 집착하지 않고 무상(無相)함을 받아들임 → 해탈과 평화가 옵니다.
해결책은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四聖諦)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삶의 근본적인 진리를 설명합니다. 사성제의 苦·集·滅·道(고집멸도)는 실천적인 진리로서 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괴로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苦), 그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集)를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려는 실천(滅)을 통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괴로움의 완전소멸은 해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야심경의 ‘오온계공(五蘊皆空)’, 일체의 모든 법이 공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오온은 몸(色), 느낌(受), 생각(想), 의지(行), 의식(識)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현상인 물질과 정신을 뜻합니다.
육체나 감정, 생각, 의지, 의식 같은 것들은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영원한 자아가 없으며 모든 것은 잠시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의 괴로움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사성제(四聖諦)에서 병이 있고, 원인이 있고, 완치 가능성이 있을 때 치료방법은 苦·集·滅·道(고집멸도)중 도성제(道聖諦)입니다. 도성제는 네 번째 진리로 괴로움을 없애는 실천 방법으로서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합니다. 이 팔정도란 우리가 마음의 경험이나 환경,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보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8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정견(正見)…바른 견해, 정사유(正思惟)…바른 생각, 정어(正語)…바른말, 정업(正業)…바른 행동, 정명(正命)…바른 생활, 정정진(正精進)…바른 노력, 정념(正念)…바른 마음 챙김, 정정(正定)…진리를 향한 바른 집중입니다.
이때 정견(正見)이 출발점이자 핵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괴로운 것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괴로움을 끊어버리고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성제와 연기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견입니다. 정견이 씨앗이고, 정사유·정어·정업·정명이 줄기와 가지이며, 정정진·정념·정정이 꽃과 열매입니다.
중생이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 깨달으면 부처가 됩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하고, 이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여야하며, 이 가르침에 따라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첫 번째 문장은 《반야심경》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대승보살인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이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 수행법을 닦아서 제법(諸法)이 공한 이치를 깨달으니 모든 괴로움이 사라져 버리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마침내 완전한 자유와 행복인 해탈(解脫)과 열반(涅槃)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보살의 뜻인 ‘깨달은 중생’에서 깨달음을 강조하면 보살은 부처라는 뜻이 됩니다. 보살은 중생구제를 해탈의 방편으로 삼으니 그가 선택한 수행 처는 고통 받는 중생이 사는 세속(世俗)입니다.
관자재보살과 같은 의미인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은 사바세계(娑婆世界)를 수행의 도량으로 삼으며 고통 받는 중생의 소리를 듣고 그 괴로움을 덜어주는 전지전능한 자비로운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부르면 언제 어디든지 나타나서 도움을 줍니다. 관세음보살을 지극히 믿는다면 자잘한 인생살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저 언덕에 이르는 방법에는 육바라밀(六波羅蜜)이 있습니다. 수행자에게 필수적인 실천지침이자 이상적인 인간상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육바라밀의 첫째는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입니다. 보살의 경지인 성인은 베풀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무주상보시(無主相布施)입니다.
두 번째는 지계바라밀(持戒波羅蜜)입니다. 지계(持戒)는 계율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못된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등이 오계(五戒)입니다.
세 번째 인욕바라밀(忍辱波羅蜜)입니다 저마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게 없이 다만 서로 다를 뿐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없기에 참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相)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정진바라밀(精進波羅蜜)입니다. 나태함을 버리고 꾸준히 수행과 선행에 힘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선정바라밀(禪定波羅蜜)입니다. 선정바라밀은 마음을 고요하게 집중시켜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을 말합니다. 선정(禪定)은 번뇌가 사라져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뜻합니다.
여섯 번째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은 육바라밀(六波羅蜜) 중 가장 대표적입니다. 모든 존재는 공(空)하다는 것을 꿰뚫는 지혜로 열반에 이르는 완전한 깨달음이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반야바라밀을 해설하는 전문경전입니다.
《반야심경》의 전체가 반야바라밀의 실천과 깨달음을 보여주는 경전이며 이 지혜는 모든 수행(보시·지계·인욕·정진)을 해탈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특히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은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아집(我執)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세워 자기가 옳음을 고집하는 법집(法執)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강을 건너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제법무아(諸法無我)에서 제법은 사물이나 마음작용 등 모든 존재를 말하며, 공(空)한 이치를 알아야 우리의 수행이 해탈과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으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법공상(諸法空相)에서 제법이 공(空)하다고 하면 제법이 본질적으로 변하여 실체가 없으므로 다툴 일이 없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을 좇는 우리의 오감(눈·귀·코·혀·몸)의 반응이 윤회(輪廻)를 만듭니다. 오감의 쾌·불쾌에 끌리고, 미워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우리를 행동 하게하고, 그것이 윤회를 만듭니다.
우리 인생 일체가 다 고(苦)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못보고 착각해서 생긴 것으로 그 착각에서 깨어나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고뇌는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생각과 고집으로 만들어진 일들입니다 “어느 누가 나쁘다.” 라는 생각은 내 마음이 지어낸 것으로 사실과는 다릅니다.
“모든 것은 공(空)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욕망에 집착하므로 초조한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야심경(般若心經)》은 짧은 경전이지만, 불교의 핵심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바로 ‘공(空)’, 즉 모든 것은 본래부터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 감정, 생각, 고통, 심지어 지혜까지도 모두 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너무 애쓰거나 집착하지 않고, 훨씬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얻을 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마침내 평화로운 상태에 이릅니다. 저는 《반야심경》을 통해 집착을 줄이고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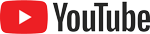 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