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유나 기자] '얼굴이 화끈했다' 혹은 '뜨끔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같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만든 '업무추진비 맛집지도'를 보고 든 감정이다. 대전의 기관장들이 기자간담회, 언론간담회를 위해 기자들과 시민 세금으로 한우집, 참지집 등을 오가며 인당 4만원이 넘는 고가의 식사를 한 내역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나 또한, 취재원들과 네트워킹 명목, 간담회 명목으로 고급 식당에 동행했던 같은 기자로서 부끄러웠다.
물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한도가 5만원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행태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고물가로 만원짜리 외식에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 이 때문에 회사에 갈 때도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고 마당에 시민 세금으로 고가의 음식을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먹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지방 기자인 나 또한 그런 비싼 음식을 '내돈내산'할 자신은 없다.
그래서일까 요즘은 일부러 '혼밥'을 한다. 취재원과의 네트워킹은 차 한잔으로 마무리한다. 고급 정보는 취재원과의 술자리, 식사자리에서 나온다는 언론계에서 '혼밥하는 기자'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진 모르겠다. 그래도 꿋꿋이 혼밥하는 이유는 어떤 윤리의식이나 사명감보다는 찜찜한 건 못 참는 다소 고지식한 성향 때문인 것 같다. 누군가는 이름처럼 '참 유난스럽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기자들이 주변에 있어 다행이다. 아는 선배도 같은 이유로 혼밥을 한다고 전했다. 김주완 전 경남도민일보 기자가 쓴 '대한민국 지역 신문기자로 살아가기' 책에 따르면, 경남도민일보 기자들은 아예 저녁 식사 약속을 절대 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저녁 약속을 할 경우라도 2차는 절대 가지 않는다고 한다. 언론사 내부적으로 어떤 규율을 만든 것 같다.
채식은 여전히 마이너한 문화지만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얻어 먹지 않는' 혹은 '더치페이하는' 출입처와의 식사 문화도 언젠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한때는 언론계에 만연했다고 하는 '촌지 문화'가 이제는 자취를 감춘 것처럼.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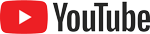 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