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세계는 인구감소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있다. 한때 모든 지역을 살려내는 균형발전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스마트 슈링킹(Shrinking smartly without sinking)’, 즉 줄어드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한 길을 찾는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5일 대전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이 강하게 제기됐다. 손정원 런던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모든 지역을 살리려는 기존 균형발전은 비현실적이며 이미 실패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김상민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더 이상 인구수 집착에 매달릴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 흐름과 국내 학계의 목소리가 정확히 맞닿은 대목이다.
대전 동구가 지난 1월 ‘2030년 인구 30만 시대’를 내걸고 미래세대국을 신설한 것은 이러한 논의와 결이 다르다. 그러나 이는 비판보다 기초지자체의 절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읽어야 한다. 고령화, 청년 유출, 학령인구 감소라는 삼중고 앞에서 구 단위가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은 여전히 ‘숫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숫자는 지역의 생존을 걸고 내세운 목표이자 구호다.
관건은 국가와 광역의 전략이다. 정부가 내세운 ‘5극 3특’ 구상은 수도권-비수도권 구도를 넘어 권역별 성장거점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거대 거점을 육성하려는 국가 전략과, 기초단위가 생존을 걸고 내세우는 인구 목표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간극이 존재한다. 대전시 역시 저출산 대응, 정주여건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은 단편적 사업 나열을 넘어선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삶의 질 중심’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어떻게 실제 정책으로 구현할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부족하다.
세계적 담론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거대 도시권 전략과 데이터 기반 정책, 삶의 질 중심 전환 없이는 인구감소의 파고를 버텨내기 어렵다. 기초지자체의 몸부림을 존중하되, 국가와 광역이 이를 권역 단위의 전략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지역은 숫자에 갇힌 채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 것이다.
결국 인구정책의 본질은 단순한 인구 규모 확대가 아니다. 줄어드는 현실을 인정하되, 남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나은 교육과 일자리,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지를 묻는 데 있다. 숫자는 목표일 수 있지만, 삶은 정책의 최종 목적이어야 한다. 이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인구정책은 수치의 공허한 경쟁에 머물고 말 것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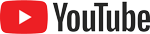 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