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의 여름밤을 수놓았던 0시 축제가 막을 내렸다. 민선8기 임기 동안 사실상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축제를 두고, 대전시의회에서는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청소년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숙 의원(민주·비례)은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근거로 실제 방문객 수와 외지인 유입 효과를 재분석하며 “축제 효과를 과장하기보다 원도심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진영 의원(민주·유성구2)은 심야 공연에 몰린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와 음주 예방책이 부실했다며 “화려한 무대보다 시민 안전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0시 축제의 탄생 배경에는 지역적 절박함이 있었다. ‘노잼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야간관광을 활성화하며, 침체된 원도심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목표가 민선8기 시정의 핵심이었다. 축제는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도시 브랜드를 재구성하고 청년과 관광객을 끌어오려는 전략적 수단이었다.
성과 역시 분명하다. 올해 미래존은 드론 축구, XR 반도체 체험, GPT 기반 ‘꿈돌이 로봇’ 등으로 채워져 가족과 청년의 발길을 끌었다. “킬링 콘텐츠가 없다”는 지적은 다소 개선됐다. 미래존의 체험형 콘텐츠가 보강되며 시민들로부터 “예전보다 세련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3년 연속 ‘3무(無) 축제’를 이어간 점은 운영의 성숙을 보여준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하다. 매년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축제가 실제로 외지인을 끌어오고 지역 상권에 이익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된다. 원도심 상인 다수가 축제 기간 영업을 포기한 현실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청소년 안전 문제는 단순 운영 미비가 아니라, 축제 철학의 빈틈을 보여준다.
더 큰 변수는 정치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정권이 교체된다면, 0시 축제의 운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꿀잼 도시 대전’을 내세운 민선8기의 대표 브랜드였지만, 새 시정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 축제가 정권의 성과사업에 머무를 경우, 지속성과 일관성은 쉽게 흔들린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객관적 성과평가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세계적 담론도 같은 길을 가리킨다. ‘스마트 슈링킹(Shrinking smartly without sinking)’, 즉 규모 확대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전략이 주목받는다. 이장우 시장이 에든버러 축제를 벤치마킹하며 관 주도에서 민간 이양을 고민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관이 아닌 시민과 민간이 주도할 때, 축제는 특정 정권의 이벤트를 넘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대는 지금부터다.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평가하고, 정치적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 그 과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화려한 불빛은 꺼지면 그만인 일회성 이벤트에 머물고 말 것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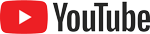 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