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도시의 인구 문제는 흔히 ‘얼마나 늘었느냐, 얼마나 줄었느냐’로만 이야기된다. 그러나 도시의 생명력은 숫자의 높낮이가 아니라, 그 숫자를 이루는 사람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에서 갈린다. 대전연구원이 6일 마련한 인구정책 토론회에서도 그 지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총량 중심의 인구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전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감소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이동의 경로다. 서구에서 유성구로, 다시 세종으로 이어지는 생활권의 순환, 유학생과 전문 인력이 대전에 머물지 못하는 사유, 동·중구의 고령화 속도처럼 도시 내부의 균형이 흔들리는 양상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인구 총량 목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정작 필요한 것은 지역별 이동의 원인을 읽어내고, 각 생활권이 어떤 기능을 잃고 있는지, 어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진단하는 일이다.
외국인 인재 정책 역시 비자나 체류 연장 같은 기술적 문제보다,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가라는 훨씬 생활 가까운 질문 위에서 재구성돼야 한다.
자치구 간 상생 메커니즘의 필요성이 거론된 것도 그 때문이다. 특정 구에 개발과 인구가 몰리고, 다른 구는 인구가 급속히 비어가는 흐름을 방치한다면 도시 전체의 안정성은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 인구·정주·외국인 정책을 따로따로 떼어 놓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체계로 묶는 통합적 접근이 절실하다는 논의도 같은 맥락이다.
정책 방향을 단순히 ‘늘릴 것이냐, 지킬 것이냐’로 가를 수는 없다. 다만 이번 논의가 일깨운 것은, 대전이 더 이상 총량을 바라보는 방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이다. 어디에서 빠져나가고, 어떤 지역이 버티지 못하며, 어떤 인재가 정착을 망설이는지, 그 움직임을 읽어내는 일이 먼저다.
도시는 숫자로 기록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건 사람의 선택이다. 대전이 붙잡아야 할 것도 그 선택이 만들어내는 흐름일 것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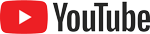 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