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한 아이가 병상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재활치료는 멈췄고, 병원의 불은 꺼졌으며, 그 곁을 지키던 손들은 끝내 병원을 떠났다.
치료의 중단은 협상의 결과였고, 협상은 한 사회의 구조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았다.
“공공이란 이름 아래,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어떤 하나의 제도나 기관이 아니다.
그 이름은 가장 약한 존재들
중증장애아동의 호흡,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보호자의 숨결,
시민이 직접 만들어낸 최초의 ‘공공의 기적’이었다.
이 병원의 시작은 병상이 아니라 거리였다.
재활치료를 찾아 전국을 떠돌다 끝내 길 위에 선 가족들.
그들의 절박함이 모여,
우리는 이 병원을 세웠다.
그러나 병원은 멈췄다.
운영비는 부족했고, 중앙정부는 지원하지 않았으며,
지방정부는 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은 ‘떠나지 않기 위해’ 파업을 선택했고,
아이들은 다시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공백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 멈춤의 대가를,
그 누구도 충분히 감당하지 않았다.
소아 재활치료는 단지 의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회복력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다.
단 하루, 단 일주일, 단 한 달의 지연은
그 아이의 평생을 바꾼다.
치료는 ‘선택’이 아니며,
그만둘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이것은 삶의 권리이고, 생애의 기반이다.
그럼에도 공공은
적자 구조라는 명분으로,
예산 타령이라는 논리로,
그 치료를 늦추었고, 멈추었고, 무기한으로 유예했다.
이것은 행정의 지연이 아니라, 책임의 포기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책임 안에 있다.
이번 파업은 ‘정근수당 20%’라는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노조는 접점을 찾았고, 시는 일정 부분 양보했다.
병원은 다시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이 ‘멈춤’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
기억되지 않는 공백은,
다시 반복되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는 ‘적자’일 수 있다.
아니, 적자여야 한다.
그 적자는 이 사회가 약한 존재를 품고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유일하고도 마지막인 약속이다.
따라서 이번 병원의 멈춤은,
결코 병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묻는다.
공공이란 무엇인가.
공공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회인가.
공공병원은 이윤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재정 효율이나 행정 실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그 병원은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로 존재하며,
아이들이 오늘을 견디기 위해 세워진 공간이다.
그 아이들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이름의 무게를 다시 짊어져야 한다.
오늘 병원은 다시 움직인다.
그러나 공공이라는 말이 진짜 살아 있으려면
이 구조는 재설계되어야 한다.
책임은 분산되지 않고,
지원은 분명하게 다다라야 하며,
모든 제도는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한다.
치료는 늦출 수 없다.
공공은 지연될 수 없다.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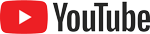 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