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추석 연휴 첫날, 원래는 친구와 관악산을 오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침부터 내린 비에 친구는 산행을 포기했다. 다행히 오전 9시 무렵 빗줄기가 잦아들었고, 나는 도봉산으로 목적지를 바꿔 나홀로 길을 나섰다. 11시경 도봉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할 때는 비가 거의 그쳐 있었다.
탐방로는 마당바위와 천축사를 거쳐 신선대에 이르는 코스였다. 길은 화강암 지대의 가파른 오르막이 이어져 숨을 고르게 했다. Y계곡 코스가 있었지만 장비 없는 탐방객에게는 위험한 구간이라 우회했다. 중급 난이도의 경로였으나, 서울의 바위산답게 결코 만만치 않았다.
신선대 정상에 닿자 시야가 열렸다. 빽빽한 숲과 기암괴석 너머로 도심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600년 도읍의 터전을 지켜온 산이 왜 중요한 입지였는지를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무학대사가 이성계와 함께 조선 창업을 기도했다는 회룡사, 선비들의 도학 정신이 깃든 도봉서원, 시인 김수영의 시비까지, 도봉산은 산세와 더불어 서울의 정신사를 함께 품고 있다.


도봉산의 최고봉은 해발 739.5m의 자운봉이다. 만장봉, 선인봉, 오봉, 여성봉이 나란히 서 있어 산 전체가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처럼 보인다. 선인봉은 암벽등반의 성지로도 잘 알려져 있고, 칼바위·기차바위·피바위처럼 이름난 바위들도 산행의 재미를 더한다.
비록 북한산보다 고도는 낮지만 도봉산은 의외로 더 힘겹다. 고저차가 크고 암릉이 많아 사고가 잦고, 실제로 매년 사망 소식이 들려온다.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가 상주하는 이유다. 정상부에는 안전 펜스와 함께 사고 사례를 알리는 안내판도 세워져 있다.
탐방로 초입에서 만난 우암 송시열의 암각문은 ‘봉우리에 길이 있다’는 도봉산의 이름을 설명해 준다. 길은 바위 위로 이어지고, 바위는 곧 길이 된다.
추석 연휴 첫날, 홀로 오른 산행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빗방울에 젖은 화강암의 색감, 도심을 굽어보는 정상의 조망, 그리고 산 곳곳에 남은 역사와 전설이 길동무가돼 주었다. 도봉산은 오늘도 서울을 지키는 산, 시민을 품는 산으로 살아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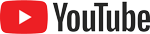 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