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정작 그 안에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항들이 담겨 충남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특별법안은 총 7편 29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교육감 선출 방식 특례 조항은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이 조항은 교육감 선출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직선제 대신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로 바꿀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다. 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충남교육청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종합 충남지부(지부장 오수민)도 “정치 논리에 의해 교육감이 임명된다면 교육도 정치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특별법안에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부터 교육·학예에 대한 감사까지 교육자치와 직결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 일련의 법령과도 충돌할 여지가 높다.
교육자치 훼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절차’다.
충남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이 성명을 통해 지적했듯, 행정통합 추진을 논의한 민관협의체에 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대표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 민간협의체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는 있었지만, 교육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공식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없다.
주민설명회에서 교육과 관련해 언급된 것은 “행정통합 이후에도 농어촌 특별전형은 유지된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등의 민감한 사안을 공개할 경우 자칫 교육계의 반발로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 일각에서는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데, 아무리 도와 민간협의체가 교육계 인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교육계를 대변했어야 했다”며 오히려 책임을 교육청에 돌리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접근이 아닌가.
대전과 충남은 교육재정, 학령인구 구성, 학교 유형 등에서 확연히 다르다. 그런데 행정통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충남에서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씁쓸하다.
뒤늦게나마 대전지역 교원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전교육청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칫 교육자치 훼손에 대한 침묵은 사실상 동조로 읽힐 수 있다.
교육감의 선출 방식부터 교육과정의 설계, 감사권의 범위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좌우한다. 다시 말해 교육을 배제한 행정통합은 반쪽짜리 계획일 뿐이다.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소통 없이 밀어붙인 행정통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단기적인 정치적 목표나 구조 개편 논리로 쉽게 재단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제 공은 행정안전부와 국회로 넘어간다.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대화다. 교육계가 왜 분노하는지,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행정통합의 출발점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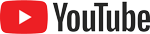 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TV 